새벽 다섯 시 즈음, 시골집 마당을 서성거리며 나는 잠시 심호흡을 하는 가운데 고민을 한다. 뒷산에서 터져 나오는 새들 소리 때문이다. 명색이 글쟁이인데 숲의 심연에서 울리는 새들의 지저귐을 어찌 표현해야 하는지 도무지 막막하다. 자연의 시를 품은 이 노래들은, 인간에게 표현되기를 거부하는 듯하다. 새들을 통해 전하는 신비로운 푸른 숲의 ’새벽 말씀‘이다.
수십여 종일까, 아님 수백여 종일까. 서로 전혀 다른 소리가 모여 숲을 울리면, 내 안에서도 깨어나는 자아의 울림이 들린다. 새들은 다섯 시를 전후하여 일제히 지저귀기 시작하여, 40여 분 남짓 찬란한 소리의 향연을 펼치다가 서서히 잦아든다. 나는 매일 아침 이들에게 순환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느끼며 시골집에서 하루를 시작한다. 어디로든 무한히 날아갈 듯한 이 숲의 음악을 고요히 혼자 듣는다는 게 아쉬울 뿐이지만, 이곳 일상에서 얻는 나의 보석 중의 보석이다.
방으로 들어온 나는 컴퓨터를 켜고, 트위터 등 출판사의 SNS나 블로그 이곳저곳에다 책 홍보 포스팅을 한다. 오늘은 월요일, 직원들 출근 시간 한참 전인데 마음이 벌써 부산하다. 일하는 장소가 서울에서 시골로 바뀌었을 뿐이지 어느 업무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다. 특히 월요일은 한 주 동안 처리할 업무를 직원들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놔야 한다. 서울 사무실에서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시골에서는 때마다 어머니를 챙겨야 하니 몸도 마음도 좀 더 바삐 움직여야 한다.

어머니는 지난밤에도 신경통 통증을 겪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새들은 저리 난리지만 어머니가 주무시는 안방의 고요는 깊다. 어머니는 자정을 훨씬 넘어서야 잠이 들었을 것이고, 지금쯤 한잠 중이다. 아침밥을 안쳐 놓은 채 묵주를 챙겨 집을 나섰다. 운동과 산책을 겸하는 묵주기도 시간이다. 마을 신작로를 따라 묵주기도를 하며 걷다가 철길을 벗어나면, 간척지 논들이 펼쳐져 있다. 벼들이 벌써 착근하여 온통 시퍼런 가운데 논 여기저기 백로들이 하얀 꽃처럼 서 있다.
남파랑길 일부인 기다란 강둑을 걷는다. 썰물이 밀려오는 기세가 제법 느껴진다. 오늘은 아홉물이다. 지난밤 10시경 만조가 되었다가 새벽 4시경 간조가 되었던 바닷물이 다시 밀물로 들어오는 것이다. 오전 10시경이면 다시 만조 수위의 찬물때가 될 것이다. 마을 앞에 강을 끼고 이처럼 걸을 수 있는 강둑이 있다는 것이 내게는 축복이다.
건너뜸 섬들은 내 감정의 징표이다. 섬들은 때로 외롭고, 쓸쓸하며 근심스럽다. 누군가 그리울 때마다 섬에서 반짝이던 불빛 하나를 지워버렸다. 내가 그리워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섬들은 여전히 내게 쉬 건널 수 없는 아픈 존재로만 다가온다.

묵주기도를 하며 걷다가, 직원들과 전화로 미팅할 일을 떠올리거나 어머니 아침 찬거리를 무엇으로 해야 하나 걱정을 하기도 한다. 밤새 신음을 토하였으니 아침 입맛이 까칠해서 무얼 해드려도 입매 정도로 그친다. 벌써 태양이 뜨겁다. 지난밤 만조로 아직 물기 촉촉한 개펄에서 반사되는 햇살이 눈 부시다. 날마다 봐도 개펄 위에서 꼬무락거리는 농게와 짱뚱어들은 내게 신비로운 존재이다.
얼른 샤워를 끝낸 후 부엌으로 들어와 앞치마를 걸치고 고무장갑을 끼었다. 직원들과 미팅을 하려면 부지런히 서둘러야 한다. 어머니도 곧 일어나실 것이다. 내가 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침 식탁은 된장국, 구운 갈치 한 토막, 김, 달걀 프라이 정도이다. 아직 된장국은 끓여보지 못해, 내가 원하는 아침 밥상을 차려보지는 못하였다. 만능으로 써먹는 멸치 육수가 있으니, 된장국도 곧 끓이게 될 것이다.
곰탕 고기 대신 달걀을 풀어 넣고 대파를 넣어 어머니 국을 준비하였다. 남은 음식을 잘 버리지 못한 나는 내 국은 별도로 끓였다. 어제, 그제 남은 국을 섞어 잡탕국을 끓인 것이다. 한 끼 먹는데 별 미련이 없는 내게 딱 어울리는 짓이다. 생선은 저녁에나 굽기로 하였다. 호박과 스팸을 썰어서 풀어 놓은 달걀을 듬뿍 묻혀 프라이팬에다 부치니 두 가지 반찬이 뚝딱 되었다. 여기에다 갓김치, 총각김치, 젓갈 등을 올려 어머니의 아침 밥상을 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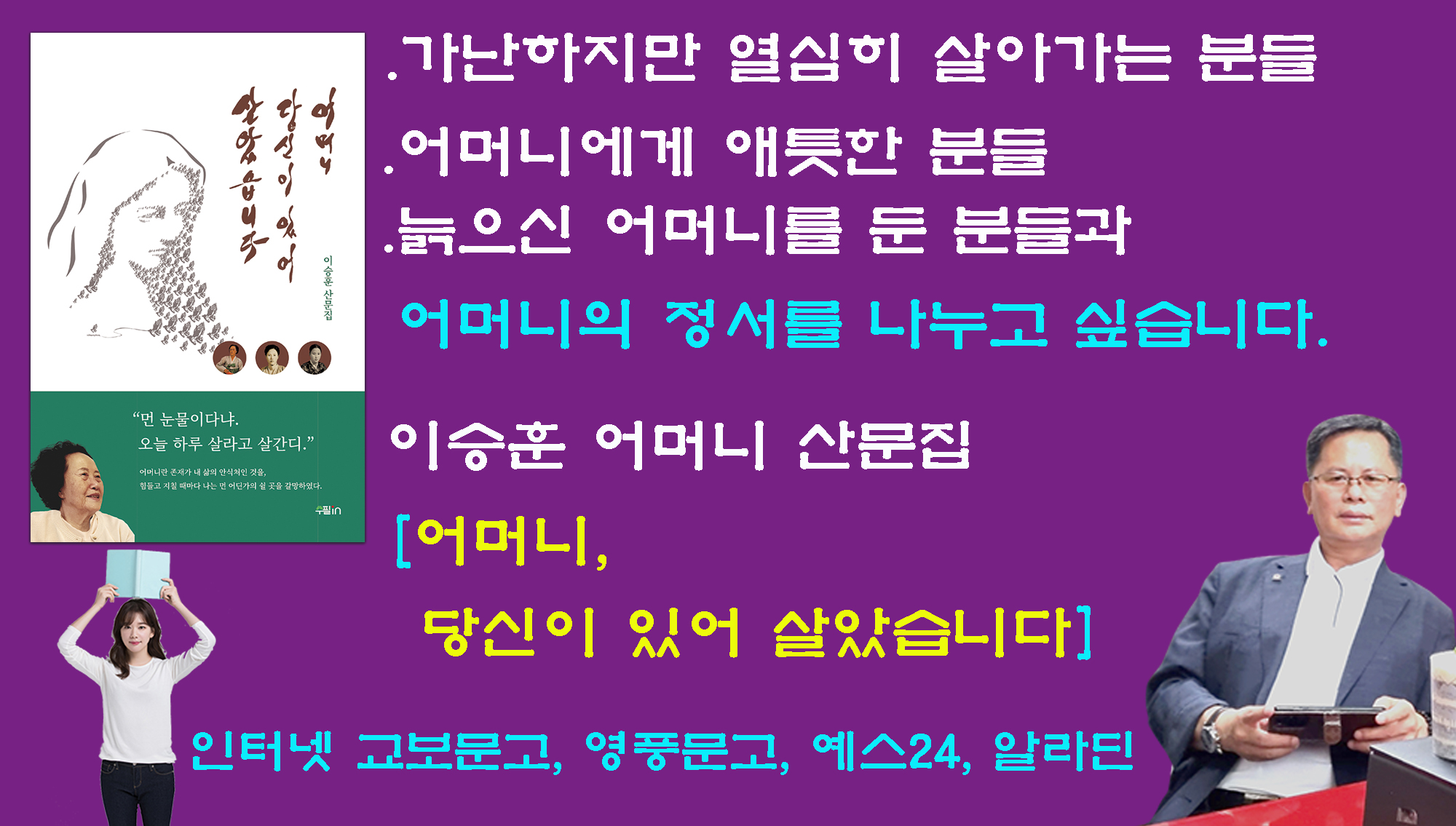
이 나이 되도록 누군가의 밥상을 하루 세끼 꼬박 챙겨본 일은 처음이다. 어머니 역시 91세 되도록 곁에서 누군가 차려주는 세 끼 밥상을 받아보기는 처음이지 싶다. 30년 세월 서울에서 자식들과 살았어도, 자식이나 며느리 모두 직장 생활을 하였으니 당신 홀로 식사를 챙기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부엌 바닥으로 물을 튀어가며 후다닥 설거지를 끝내고,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직원 미팅을 마무리하였다. 영상 통화를 해도 되지만 우리 예쁜 여직원들 얼굴이 이상하게 보여 전화 스피커폰으로 목소리 미팅을 한다. 미팅하기 전 편집장님이 한주 출간 작업표를 이메일로 보내온다. 이번 주도 꽤 바쁘게 움직여야 할 듯하다. 내가 부재중이어도 편집장님이 잘 챙겨준 덕분에 시골에서 어머니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동안 여러 찬거리를 만들었다. 처음에는 막연하기만 하던 요리가 무작정 시도를 해보니 그럭저럭 밥상은 차려졌다. 때론 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어제는 순천 요리학원을 알아보았다. 하루 이틀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다 말 일이 아니다. 그럭저럭 밥상을 차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 같아, 기본적인 요리는 제대로 배워야 할 것 같았다. 한식 과정을 알아보니 4주 동안 재료비 포함 50만 원이란다. 저녁 시간을 이용하면 별문제는 없을 듯한데, 꼬박 4주 동안 다닐 수 있을까 싶었다. 올라가야 할 일이 생기면 금세 서울 사무실로 올라가야 하고, 한 번 올라가면 바로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요리학원은 좀 더 고민하기로 하였다.
어머니와 함께 살아보니 10년, 20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였는지 깨닫게 된다. 모자간의 동거란, 어머니도 나도 서로 적응 기간이 필요한 일이었다. 아무리 어머니와 아들 사이라 해도, 뜬금없이 단둘이 살게 되면 부딪치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었다. 91세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일은, 나의 대부분을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었다. 나는 그저 조금씩 노력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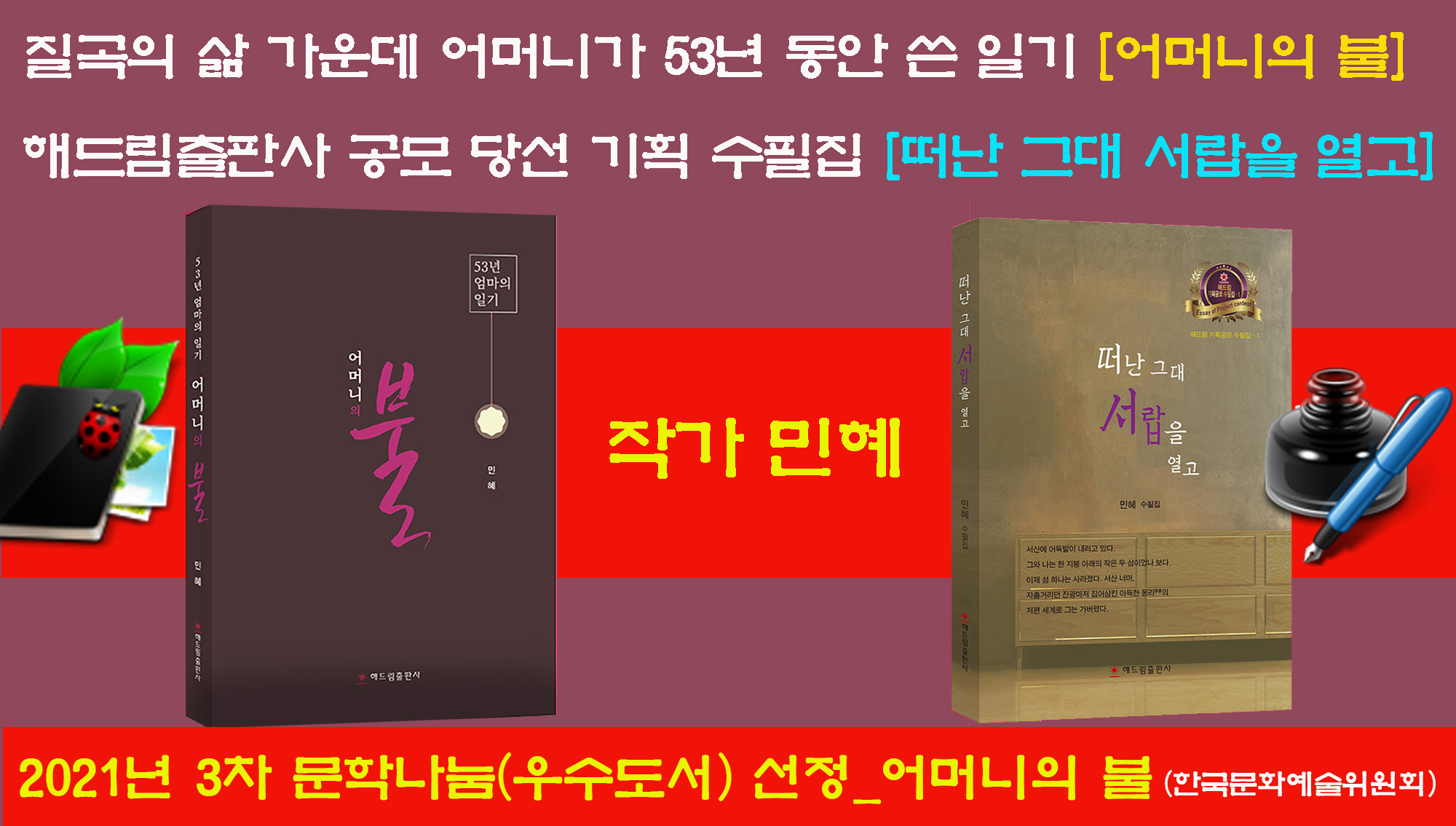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영건설 이중근 회장님과 은은한 추억의 상자 고향 (0) | 2023.06.28 |
|---|---|
| 탤런트나 배우는 왜 막장 드라마 거부를 못하나 (0) | 2023.06.27 |
| 시청자 영혼을 파먹는 막장 드라마, 작가 정신이 없다 (0) | 2023.06.27 |
| 91세 어머니와 함께 살기…대신 죽을 수는 있어도 대신 아플 수는 없다 (0) | 2023.06.21 |
| 60대 아들의 91세 어머니와 함께 살기…잔소리 (0) | 2023.06.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