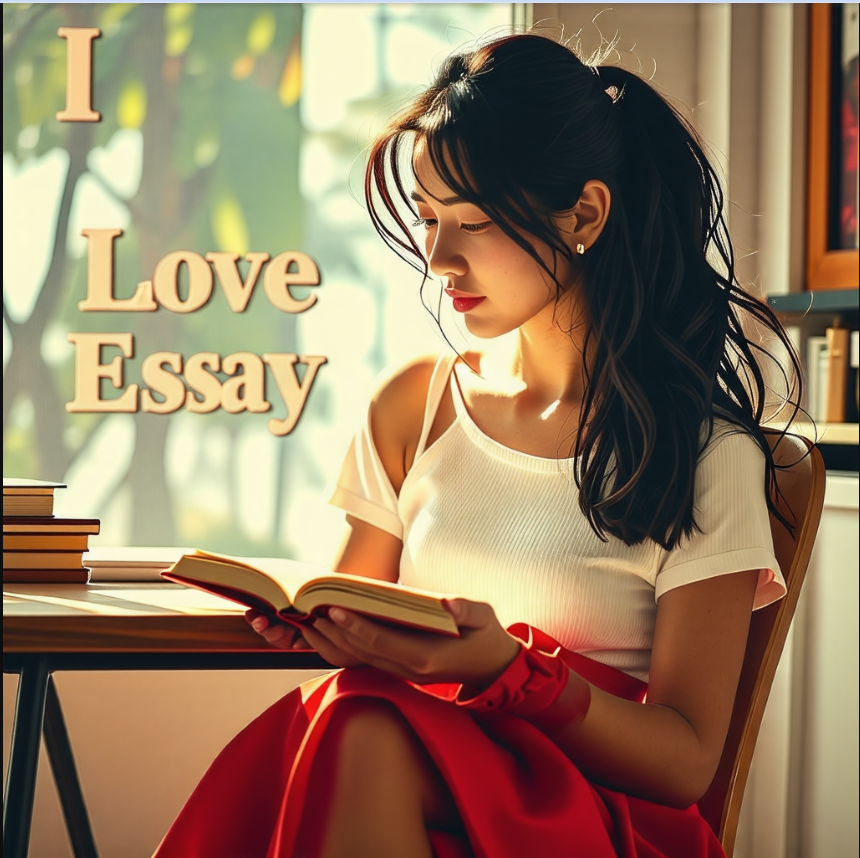
…
나는 한(恨)이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어떤 애틋함이 한일까? 어떤 슬픔이 한일까 하고 진정 가슴으로 느껴보지 못한 우리말의 어휘가 한(恨)이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한이라는 어휘가 비로소 절절하게 가슴에 다가왔다. 한은 가없는 그리움이었다.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이었다. 곁에 계시면, 살아 계신다면 어머니의 다정한 벗이 되어 모녀간의 정을 살갑게 나눌 수 있을 텐데…… 여인의 생애를 가슴 깊이 공감하며 분꽃처럼 화사했던 어머니의 미소를 싱그럽게 가꾸어드렸을 텐데,
칠석날 저녁, 밤하늘을 바라보려 공원에 나갔다. 하늘에는 은하수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마음 깊이 간직해두었던 그리움의 실타래를 꺼내어 은하수의 여울, 그 커다란 수틀에 한 땀 한 땀 오작(烏鵲)의 징검다리를 수놓기 시작했다. 가없는 그리움에 애틋한 마음이 까맣게 졸아들고 졸아들어 수놓아진 오작의 징검다리였다. 징검다리가 하나둘 완성되고, 어머니는 드디어 은하수 저 건너편에서 분꽃 같은 미소로 다가오고 계셨다. 어머니의 미소는 칠석전야제의 하늘에서 밤을 지새우고 아침 햇살이 비추기 전 새벽녘까지 흐르는 기쁘고도 슬픈 눈물이었다.
-소현숙 수필집 [감미로운 연말정산] ‘칠석 전야제’ 중에서
'★★수필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필집 제목 짓기, 감동을 더하는 15가지 비법 (0) | 2025.01.06 |
|---|---|
| 여류 수필가들의 섬세한 표현력 6 (0) | 2024.10.07 |
| 여류 수필가들의 섬세한 표현력 4 (0) | 2024.10.06 |
| 여류 수필가들의 섬세한 표현력 3 (0) | 2024.10.06 |
| 여류 수필가들의 섬세한 표현력 2 (0) | 2024.10.05 |



